한국에 자격증 보유자 50명뿐
죽은 동물을 복원하는 박제사
박제는 하나의 미래 연구 자원


출처: 경인일보
대한민국에 0.0001%만 가지고 있다는 그 직업은 바로 박제사이다. 박제사는 전시와 연구,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죽은 동물들을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복원하거나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.
박제사 자격증은 합격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현재 자격증 보유자는 국내에 50명 정도이다. 자격증으로 제일 많이 뽑을 때 3명 정도 합격하는데 실제로 10명이 응시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박제를 해 온 사람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.
박제사는 동물이 죽으면 수의사가 부검을 하기 전 박제를 할 것인지 골격표본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. 외상이나 피부 괴사가 있을 시 골격표본으로 작업이 시작되고 가죽을 벗겨서 박제실로 가져오게 된다. 이후 살점을 제거한 가죽을 동물에 씌워서 방부제를 바르고 봉합한 뒤 건조한다. 건조가 끝나면 색이 바랜 부분은 색칠하고 동물명, 폐사 일자 등 정보를 기록한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박제 작업이 마무리 된다.

이런 과정과 죽은 동물을 전시한다는 점 때문에 박제사들은 ‘잔인하다’, ‘죽어서도 동물에게 못할 짓이다’ 등의 악플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. 그래서 박제사들은 박제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.
박제사들은 박제를 하나의 미래 연구 자원이라고 보고있다며 생물학적인 자료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.

출처: 서울경제

출처: 서울신문
박제사가 되기 위해선 박제에 도움이 될 만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방법이다. 국내에는 박제에 관한 학과나 전문 교육 기관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윤지나 박제사는 “박제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생물학과나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 또한 “동물의 생태와 해부학을 공부하고 모형이나 그림을 연습해보면 박재사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을 것”이라 덧붙였다.
박지나 박제사는 올해 임인년을 맞아 서울대공원에서 15살의 나이로 자연사한 시베리아호랑이 ‘강산’이 재탄생시켰다. 윤 박제사는 표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“표본을 생물학, 수의학 교보재로 활용하는 등 연구 데이터로 많이 활용해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언젠가 한국에도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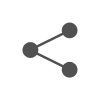

댓글0